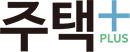“가시적 성과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감소에 실효성 높지 않아 대안 필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월 25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 2부에서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노동력 수요는 감소, 재해자 규모는 증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활동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볼 때 전체산업은 물론 건설업도 노동수요가 하락하는 추세다.
노동의존적인 건설업도 노동의 자본대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재해감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2022년 산업재해는 전년대비 0.02% 상승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특성의 건설업
건설업은 취업자 수 규모에 비해 사업재해가 다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은폐되는 재해도 3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해 발생 후 산재처리되지 못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방식이 타업종대비 많은 이유는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에 기인하는 요인이 크고 현장 성과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
최근 3년의 건설업 재해자 추이에서 증가양상이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재해자는 감소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감소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규정으로는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022년 사망자는 2021년에 비해 5.7%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10.8%가 감소했고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3.2% 증가했다. 즉,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산업재해현황 추이
(단위 : 명, 건, ‰)
| 구분 | 건설업 | |
|---|---|---|
| 근로자수 | 2020 | 2,284,916 |
| 2021 | 2,378,781 | |
| 2022 | 2,494,031 | |
| 재해자수 | 2020 | 26,799 |
| 2021 | 29,943 | |
| 2022 | 31,245 | |
| 재해건수 | 2020 | 26,616 |
| 2021 | 29,812 | |
| 2022 | 31,106 | |
| 재해천인률 | 2020 | 11.73 |
| 2021 | 12.59 | |
| 2022 | 12.53 | |
자료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호
규제와 처벌위주 법령의 한계
법령에 의한 규제와 처벌위주 행정은 기업을 타율적 규제에 익숙하게 만들고 자체적 시스템과 역량을 저하시킨다. 대기업은 자체적 예방시스템이 있으나 내실있는 이행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은 예방역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재발확률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6.7배 높다는 것을 볼 때 규제와 처벌위주의 법령은 실효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개편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첫번째로 고령자에게 중대재해발생시 처벌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79세 이하 연령대 취업자는 2013년 7.2% 비중에서 2023년 10.6%로 증가했다. 고령자들 중 현장경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를 확대할 대안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수단으로 고령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양형과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 건설업 | |
|---|---|---|
| 2013. 5 | 전체취업자 | 1,832 |
| 55~79세 취업자 | 415 | |
| 2023. 5 | 전체취업자 | 2,117 |
| 55~79세 취업자 | 787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두번째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가 크다. 즉,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고 노동력 활동도 많아 건설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토목공사에 비해 크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 · 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자는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소 · 중견업체가 운영하는 현장은 감리에게도 안전관리직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생주택 유튜브
생생주택 유튜브